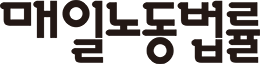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피고인들이 느꼈어야 하는 불안감이고, 이걸 방치한 게 안전불감증이다. 피고인들 가족이 그 작업장에 앉아서 작업했더라면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위험에 대비하도록 요구하는 게 안전보건상 주의의무다.”
노동자 23명 사망이라는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로 기록된 화성 아리셀 참사에 대한 재판부 판시의 일부다. 수원지법 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원을, 파견법을 위반한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산재 책임 회피 막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재판부는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 일상업무 외 의견 개진이 필요할 때 권한을 행사했고, 주간업무보고와 카카오톡·전화 등으로 세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산재사고에서 대표이사가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도 고려했다.
박 본부장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박 본부장이 박 대표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참사 이틀 전 전해액을 주입한 리튬전지라고 판단했다.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날이다. 아리셀은 그러나 화재 이후에도 생산을 강행했고, 당시 생산한 리튬전지의 불량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 전지는 전해액 주입 뒤부터 일반 공정 순서에 따라 세척공정 등을 거쳤다. 불량전지 우려가 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처 없다” 돈 주고 산 ‘처벌불원서’ 양형 반영 안 해
이 때문에 재판부는 박 대표가 법률상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리셀 참사 당시 발생한 리튬전지의 폭발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열과 가스감지기 운영 같은 리튬전지 보관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6월22일 화재 이후 불량 우려가 큰 전지에 대한 분리보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화재발생 대비 안전조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았다. 소방훈련과 위험성평가, 비상구 설치 같은 시설 안전보건 의무 등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을 받았다면 폭발 직후 대피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유족은 재판부 판단은 환영하면서도 양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주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잘 짚어 일부 위로가 됐다”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체류상 어려움을 악용해 유족과 합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인정해 감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반영해 선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40년형을 선고해도 죽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고 고통은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 최고형이라는 20년형을 구형했는데도 15년으로 감형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맹탕’ 정부대책, 제2 참사 대책 없어
아리셀 참사 장본인은 단죄를 받았지만, 제2의 아리셀 참사가 없을 것이란 보장은 하기 어렵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직후 이주노동자 안전대책과 리튬 취급 사업장 점검 등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6월 정부정책을 점검한 결과 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의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기존 대책의 짜깁기 수준이고, 리튬 취급 관련 대책이나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대책이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앞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은 없다시피하고, 아리셀이 위치했던 산업단지 같은 작은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공동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이행시기가 모호하다”며 “아리셀을 사실상 지배한 에스코넥, 그리고 공급망 최상위에서 이윤을 얻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구조적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조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