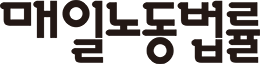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택시회사의 각종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도급제 택시기사들의 주휴시간, 월급제 택시기사들의 유급휴일·연차휴가 등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급제 기사 최저임금 산정방식 구체화한 대법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택시기사 김아무개씨 등 6명이 A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도급제 방식으로 일했다.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가져갔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A운수도 여느 회사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김씨 등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기본급+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도급제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2018년 7월에 나왔다.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임금체계였던 도급제가 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효력은 쟁점이 아니었다.
노사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다퉜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측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주급제·월급제에서 주휴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도급제 기사 ‘주급·월급 → 시간급’ 환산 필요 없어”
하급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법리는 주급제·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 관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도급제 기사들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대해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급제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김씨 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대법원이 택시 도급제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도급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에서 도급제처럼 고정급이 없는 임금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사가 도급제에 합의했다고 해도 기본급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 안 했으니 ‘연차’는 최저임금서 빼라?
월급제 택시기사들의 유급휴일·연차휴가 등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13명이 B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측은 유급휴일·연차휴가·하기휴가·특별휴가 등과 함께 업무상 교통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결근에도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이를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씨 등은 인정일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을 사측에 청구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유급휴일·병가 등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 등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기사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기사들이 주장한 인정일 전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사납금 ‘꼼수’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대법원 “줄인 시간 짧아 불법 아냐”
- 사납금·도급제 닮은 택시 임금모델 서울시·국토부 추진
- 대법원이 택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우회하는 방법
- [택시 최저인금 특례 이후] 신설 택시회사도 소정근로시간 3시간 … 대법원 “무효”
- 진보당 “국감서 의원 존재 이유 증명”
- 대법원 “택시기사 ‘만근일’ 이상 근무시간분, 최저임금 안 줘도 돼”
- [단독] 월급 없는 ‘서울형 택시임금모델’ 추진
- 택시에 최저임금 차별적용? “택시산업 파멸할 것”
- 대법원, ‘최저임금 회피’ 택시 불법 소정근로시간 판단기준 세웠다
- 사납금 폐지 외치다 두 차례 해고된 택시기사, 대법원 ‘부당해고’
- ‘성과급 100%’ 택시회사 편법, 법원 “원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