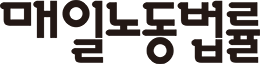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육아휴직 사용 뒤 복귀한 노동자를 강등한 남양유업의 조치를 불이익 조치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불리한 처우’ 개념을 구체화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주제의 이슈페이퍼에서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할지 모를 불이익 조치를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남양유업 사례와 유사한 호주 로이 모르건 판결을 통해 불리한 처우와 관련된 입법 과제를 살폈다.
로이 모르건 리서치사에서 근무하던 헤로드씨는 육아휴직 사용 뒤 복귀하고는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는 재고용 제안을 철회하고 유연근무 신청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호주 연방법원은 헤로드씨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의 경우 육아휴직 뒤 복귀한 광고팀장 출신 A씨가 광고팀원으로 강등, 물류센터와 천안공장으로 잇단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광고팀장에서 해임한 것이란 사측 의견을 수용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입법조사처는 “호주 연방법원은 사측의 불리한 처우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며 “남양유업 판결에서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생활상 불이익’이 “경제적 이익에 한정하는 게 아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서울행법 2009구합25415),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 중 또는 전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대법원 2017두76005) 같은 앞선 판결이 있었는데도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로 “법률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남양유업 판결이 육아휴직 사용을 앞두고 많은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박탈은 물론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공동체 상식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에 앞서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