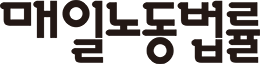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월차 등의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져 산정시점에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한다. 판례는 근무일수 등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변동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이고, 근무일수 등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해 왔다.5) 즉 회사가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체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6)나 “월동보조비”7) 명목의 금원, 실제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일정 근속년수에 이른 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이나 “근속수당”8), 미혼자와 같이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본인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9) 등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한다. 반면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연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적 급여”라 할 수 없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10)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귀성여비․휴가비 및 개인연금보험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온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지급되는 임금의 명칭에 집착해, 해당 금원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임금이 아닌 이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해 실제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성여비․휴가비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외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 나름 전향적이고 타당한 판결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연봉제 실시 이후 기존의 상여금을 대체했다는 유래,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받았고 금액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돼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업적연봉이 연초에 이미 확정돼 확정된 업적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고 지급일의 실제 근무성적․근속기간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업적연봉은 이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올해의 업적연봉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전년도의 인사평가를 통해 이미 확정됐고, 실제의 근무여부나 근속기간 등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특정일에 지급됐기에 고정적 임금에 해당돼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대상판결에 따른다면 근로자의 근무성적, 자격여부,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 등)은 근무성적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기에, 또한 기본급 등이 매년 임금 협상에 의해 변동되기에, 해당 기본급 등은 비고정적 급여에 해당되고 이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결코 찬동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판결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돼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종종 주장하는 조사수당·귀성여비·휴가비·가족수당의 본인분·보험료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근무성적과는 관련 없이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진 업적연봉은 비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각주
1)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규정이 없고, 그 정의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바도 없는데, 시행령에서 그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 정의 규정은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통상임금의 해석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제시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개념 해석에 참고만 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기덕,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한 재검토’, 노동과 법, 제6호, 금속법률원, 2006. 89-90쪽 참조)
2)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다36817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5다24074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3) 판례는 ‘사용자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등)’고 해 정기성․일률성을 임금의 개념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4) 김기덕, 위 논문, 124쪽
5) 김기덕, ‘통상임금 개념요소로서의 고정성’ 위의 책, 195쪽 참조
6)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7)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8)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9)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10)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도 모두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산정 시점에서 유동적이지 않고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한 것이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견해가 있음(김기덕, 위 논문 1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