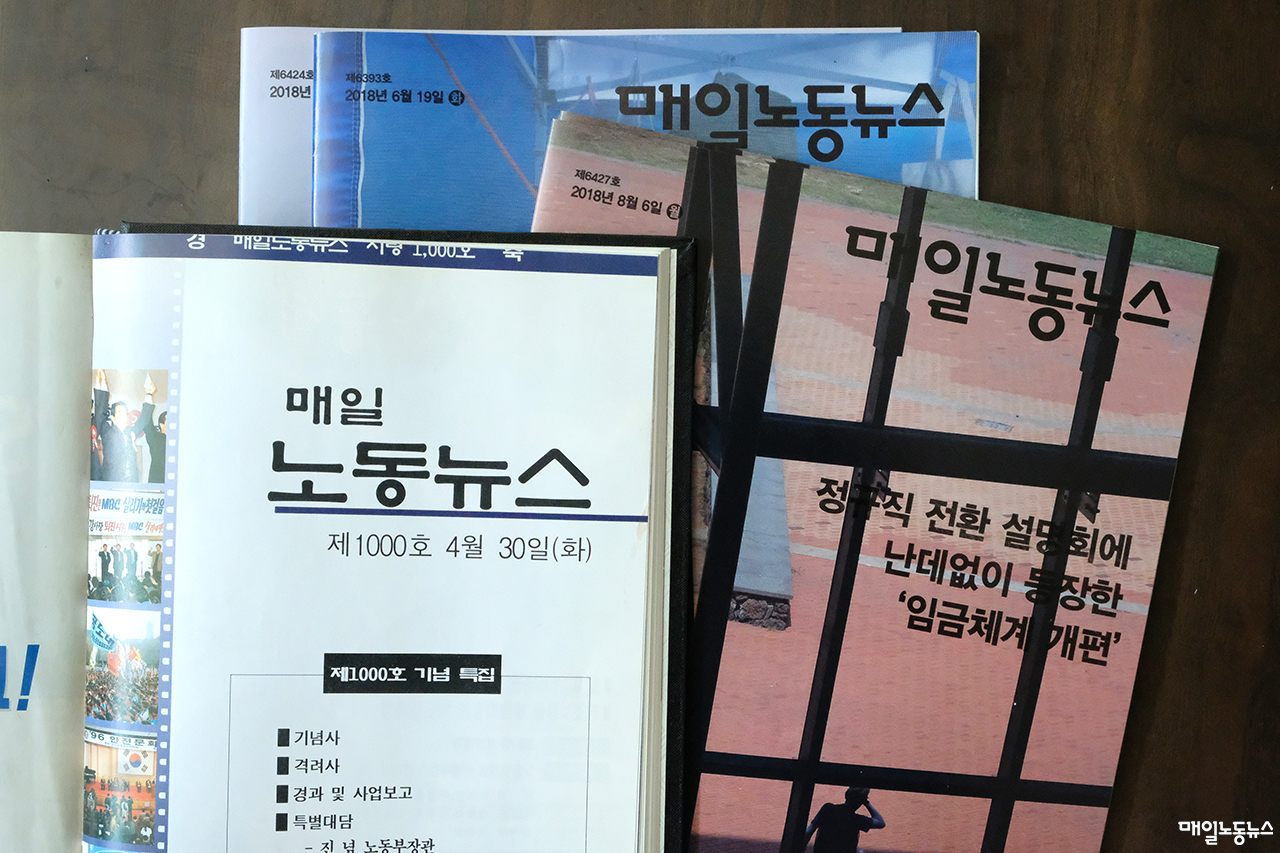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준서(26)씨는 지난달 <매일노동뉴스> 후원을 신청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전화로 이뤄졌다. 김씨는 최근 SNS에서 공유된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관련 보도를 보고, 언론에 대한 일종의 부채감과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평소 사회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왔지만, 노동 문제까지 시야가 닿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뉴스를 챙겨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뉴스를 볼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후원을 하게 됐어요.”
런베뮤 보도는 그의 인식을 크게 흔들었다. 사고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던 죽음과 뒤늦게 드러난 고용구조 문제에도 큰 충격을 받았다.
“SPC나 남양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고나 노동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엄청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씨도 런베뮤를 알고 있었다. 친구들과 ‘인기가 많다’거나 ‘줄을 서기 힘들 정도’라고 이야기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브랜드였다. 그런 곳에서 발생한 동갑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그에게 ‘노동뉴스’의 필요성을 알게 해줬다.
“언론에 염증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노동자가 된 이후 여러 일들을 겪으며 그런 뉴스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김준서씨는 런베뮤 보도와 최근 읽었던 소설을 계기로 노동뉴스에 관심을 넓혀보자는 다짐을 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노동자를 변호하는 장면을 통해 ‘그들에게도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일상을 지내다 보면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언론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지만 매일노동뉴스는 계속 봐야 할 곳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막 ‘새내기’ 후원회원으로서 김씨는 <매일노동뉴스>를 “유일무이한 언론”이라고 말했다.
“이런 뉴스는 또 없잖아요. 노동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라는 것만으로도 무척 특이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포털사이트에서 ‘후속기사 원해요’하는 반응을 누르곤 했지만 내가 원하는 뉴스를 생산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매일노동뉴스는 바로 그런 언론이에요. 일반 언론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와 노동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주고 보도하는 언론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