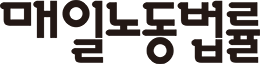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혹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사업주’ 모두에게 언어와 노사관계, 문화의 간극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정봉수 공인노무사는 바로 이 틈을 메우는 일을 한다. 영어와 한국어, 노동법과 기업문화, 노사의 ‘통역자’로서 그는 강남 한복판에서 ‘노동법의 언어’를 다듬고 번역하는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 대치동 강남노무법인에서 정봉수 노무사를 만났다. ‘외국계 기업 인사노무 넘버 원’을 내세운 정 노무사는 영어-한글 이중 언어 기반의 노동법 실무서 15종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노무사의 영어 실력이 중요한 까닭
2003년(12기)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업계에 발을 들인 정 노무사는 2005년 <노동법 바이블>이라는 이름의 책을 세상에 내놨다. 영문과 한글을 병기한 노동법 실무서다. 올해 일곱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 노동법과 노무관리 문화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는 매우 달라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 입장에선 본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국 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제 역할입니다.”
노사관계에는 법과 협약, 규정과 함께 ‘관행’도 존재한다. 노사 간에도 언어로 번역되지 못하는 정서나 문화가 녹아 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노사관계도 소통이 막히면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정 노무사는 “외국인 사업주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쌓는 원인 중 언어가 50%라고 한다면 문화가 30%”라고 말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정 노무사의 노력은 집요하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그는 노무사가 된 뒤로도 17년간 매일 아침 영어학원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오해가 오해를 낳는 불신의 노사관계를 풀어가는 열쇠
정봉수 노무사가 외투기업 노사를 상대하며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오해’다.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고방식과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다.
“예를 들어 한국 노동법이 ‘강행법’ 위주인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신의칙’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해고가 자유로운 등 법적 관점의 차이가 커서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요. 또 한국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도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서구권에선 ‘내 일과 시간’ 개념이 강해서 거절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런 문화 차를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만 만들어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남노무법인은 노동법 관련 방대한 한글-영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다. 2012년부터 개발한 이 앱(ㆍ)은 400여 개 양식과 1천700여 개 동영상, 15권의 노동법 실무서, 19개 자동 계산 기능(연차휴가, 임금대장, 4대 보험 등)이 탑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8천500건에 이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하루 접속자가 1천200명에 이른다고 정 노무사는 설명한다.
그는 기업의 규칙과 정책을 현지화(localization) 하는 작업이야말로 외국계 기업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한 ‘한영 번역’을 넘어 ‘노동법의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꾸준한 글쓰기, 시장을 개척하는 힘
정봉수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 왔다. 그 비결은 책이다. 지금까지 15권의 노동법 실무서를 출간했다. 그중 가장 잘 팔리는 책은 무엇일까.
그는 <외국인 고용과 비자 실무 가이드>를 꼽았다. 한국에 체류하는 270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비자 관련 정보, 특히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구직·워킹·체류비자 받는 과정을 점수제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노무사는 15권의 책은 하루아침에 출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20년 가까이 매달 한 편의 칼럼을 썼다. 그렇게 쓴 236개의 칼럼이 15권의 저서로 만들어진 것이다. 책을 내고 싶다며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들에게 “일단 정기 칼럼을 쓰라”고 말하는 이유다. 정 노무사는 “만들어진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로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