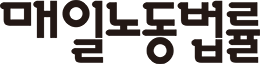버스 준공영제 노선 기사와 비준공영제 노선 기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준공영제 노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사들이 준공영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
같은 일하며 매년 1천만원 적게 받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김아무개씨 등 한정면허노선 버스기사 14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시영운수 721번 버스를 운행했던 기사들이다. 721번은 준공영제 비해당 노선인 한정면허노선이다. 한정면허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때 부여하는 면허다.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고 민간 운송업체에 운영을 위탁한다. 721번 버스는 2020년 12월 폐지됐다.
김씨 등은 준공영제 간선버스 기사들과 같은 차량을 같은 시간 운전했다. 하지만 임금은 준공영제 기사들보다 매년 1천여만원 적었다.
준공영제 기사들은 호봉제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간다. 2017년 기준 2년 이상 5년 미만 일한 간선기사는 시급 8천692원을 받는다. 반면 비준공영제 기사는 2년 이상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시급은 8천190원으로 똑같다. 상여금도 차이가 난다. 비준공영제 기사는 기본급 총액의 200%를 받지만 준공영제 기사는 기본급의 600%를 받는다. 매월 적게는 1만2천54원, 많게는 148만4천740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김씨 등은 준공영제와 비준공영제 기사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비준공영제 기사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 “비준공영제 이유로 임금 차별”
재판부는 동일노동이므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준공영제와 비준공영제 기사 업무가 비슷하고, 두 노선 채용자격에 차이가 없는 점, 두 노선 모두 1일2교대제로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점, 두 노선 모두 간선버스로 동종 차량일 뿐만 아니라 노선별 운행시간과 정류장수, 왕복 운행거리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준공영제 노선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김씨 등이 대신 운행한 경우도 있어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비준공영제 노선이 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나 김씨 등이 준공영제 기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비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시의 재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비준공영제 기사들에게 준공영제 기사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한 재정적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상우 공공연대노조 버스개혁지부장은 “준공영제가 일부 노선에만 도입된 지역에서 비준공영제 기사들이 준공영제 기사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 지선-간선 임금차별 소송도
준공영제 기사들 사이에도 임금격차가 난다. 지역 간 중·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기사의 임금이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 기사보다 적다. 지자체 재정지원금 규모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부터 차이가 난다. 지난해 인천시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간선 대형버스 운전직 급여(1일 대당 2.55명 기준)는 44만881원인 반면 지선 대형버스는 39만2천141원이다. 올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간선기사와 지선기사 시급은 많게는 2천원 가까이 벌어진다.
인천 지선기사들은 간선기사들과 똑같이 일하는 데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며 지난 2020년 2월 소를 제기했다.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모두 시내버스 운전으로 근본적 차이가 없는 점, 필요한 자격증 종류에 차이가 없는 점, 1대당 운행시간이 비슷한 점 등을 이유로 동일노동을 주장했다. 1대당 이용객은 오히려 지선이 많은 점, 지역 간 중·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 특성상 도로의 폭, 혼잡도, 경사 등으로 운전 난이도가 더 높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