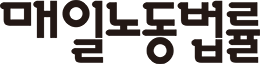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24일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가 고려대의료원을 상대로 낸 특례합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이 사건 특례합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며 “특례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고 판시했다.
지부와 의료원은 2013년 8월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합의를 했다. 이후 노사는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지부는 2013년 특례합의와 단체협약이 저촉되는 내용이므로 특례합의는 2014년 효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원은 특례합의와 단체협약은 엄격히 구분되며 유효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계속 합의가 존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가 근로자대표자로서 작성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가 없는 미조직 사업장에서 작성된 특례합의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입법공백 상태”라며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폭넓고 막강하지만 선출 절차를 비롯해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협, 유효기간 2년”
서울고법 “노조가 합의하면 단협” … “노조 없는 곳 특례합의, 여전히 입법공백”
- 기자명 어고은
- 입력 2020.12.01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