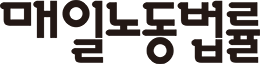석재를 자르고 갈아내는 일터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주봉씨(가명)는 어느 날 갑자기 TV 소리가 이상하게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를 놓치는 일이 잦아지자 2021년 병원을 찾았고, 곧바로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왼쪽 귀는 43데시벨(dB)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오른쪽 귀는 71데시벨까지 올려야 들린다. 오른쪽이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 귀는 산재가 아니고, 왼쪽 귀만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왜 엇갈린 판정이 났을까.
같은 사람의 두 귀, 다른 결론 이유는 만성 중이염
김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원석 절단, 할석, 연마 등 석재 가공 작업을 해 왔다. 절단 톱과 그라인더가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은 85데시벨 이상인 점은 공단도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장해급여 심사에서 공단은 좌측 귀만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했다. 좌측은 중이 질환이 없고 고주파 청력저하가 뚜렷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더 심각한데도 “만성 중이염 영향이 명확하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의학적 근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단 근거는 김씨의 청력검사 결과다. 우측 귀에는 만성 중이염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귀 안쪽의 작은 뼈가 손상됐다거나 내이(소리를 실제로 느끼는 기관)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은 없었다. 중이염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귀 자체의 감각 기능이 손상될 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청력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리가 두개골을 통해 직접 전달될 때 들리는 정도(내이 기능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는 좌우가 거의 같았다. 만약 중이염이 우측 귀 난청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이 검사에서 좌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런 차이는 없었다. 청력이 어느 구간에서 떨어지는지 살펴본 결과도 양쪽이 동일했다. 낮은 음역대는 비교적 잘 들리지만 높은 음역대로 올라갈수록 청력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 이는 석재를 자르고 다듬을 때 발생하는 ‘날카로운 고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우측 귀도 소음 때문에 내이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력 패턴은 양쪽 모두 동일”
혼합난청 업무관련성 폭넓게 인정한 법원
이효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현장 노동자는 소음성 난청과 중이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단은 중이염 존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해 실제 소음노출 피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이염이 전음기관을 손상시킬 정도가 아님을 입증했고, 이를 전제로 골도청력 혹은 좌측 기도청력을 기준으로 소음의 영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소음노출 노동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혼합난청’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본 사례로 평가된다. 중이염 같은 기존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내이 손상이 명확하고 양측 패턴이 유사하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