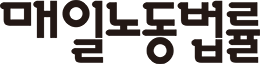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노사 합의가 무효일 때, 법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형식적 단축 합의에 제동을 건 동시에, 유효한 근로시간 정함이 없을 때 법원이 직접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경북 구미의 한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사납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2008년 개정 6조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택시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가 폐지된 뒤 고정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써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사는 2010년 이후 단체협약을 바꿔 격일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4시간, 3시간30분으로, 1인 1차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2시간15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노동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수치만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봐야”
1·2심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무효를 알았더라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시간”을 가정해 하루 5시간으로 새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격일제 기사에게는 2일 평균 10시간, 1인 1차제 기사에게는 5시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계산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5시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 “노사합의 무효라면 법원이 직접 정해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쟁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로 모였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없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관행·법규·신의칙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기준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새 근무형태를 도입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종전 근무형태의 근로시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형태만 바뀌었을 뿐 실제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종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격일제 16시간 유효, 최저임금 계산은 8시간까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격일제 근무형태에는 종전 단체협약상 1일 근로시간 16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16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은 8시간까지만 계산하고,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1인 1차제 기사들은 유효한 근로시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근로계약을 해석해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을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법원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장 관행을 토대로 노사 의사를 확인해 유효한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차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유효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종전 근로시간 없다고 기각하는 일 없을 것”
이번 판결은 200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어진 택시업계 근로시간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찬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이번 판결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를 보충해 최저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이제는 ‘종전 근로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교대제·격일제 등 장시간 근무 업종의 최저임금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확정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