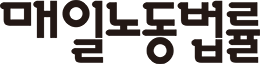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통상임금 개념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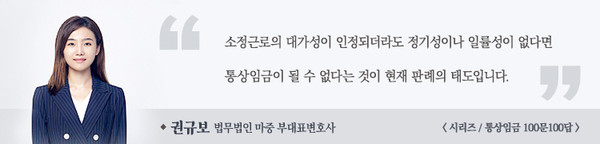
A.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1항의 문언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①소정근로의 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이 도출됩니다. 이 외에 판례는 ④고정성을 개념요소로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2023다302838)을 통해 고정성 요건은 폐기됐습니다.
이러한 개념요소들 간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 요소의 기능적 역할입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본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은 통상임금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률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둘째, 각 개념요소의 법적 위상입니다. 대체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필수 개념요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성‧일률성이 통상임금성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고 있어도 ‘정기성’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개념적 징표에 불과하므로 이들 요소 중 일부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2024년 판결(2023다302838)은 고정성을 폐기했으나, 정기성과 일률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건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정기성이나 일률성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