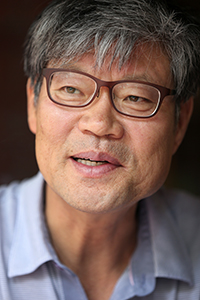
노동존중사회의 상을 찾아서
노동존중사회는 말 그대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말하다. 그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물질의 차원에서 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의 차원으로 노동자가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차원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신광영 외, 2018). 이들은 연관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해 노동존중사회란 경제성장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을 진전시키는 데 가닿는다. 사회적 차원이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됐다지만 노동자의 저항은 공권력으로 억압됐으며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탄압은 합리화됐다. 노동 유연화와 각종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삶을 ‘바닥으로의 질주’로 내몰았다. 사회는 양극화되면서 해체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내세웠지만 시장경제 발전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셈이 되고 말았다.
노동존중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의 극복, 나아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청년실업자는 물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회경제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고 런던대 SOAS 교수를 지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2014)이 <새로운 위험한 계급,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른 이들을 말한다. 불평등과 함께 차별·배제·격차라는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사회의 통합도 이뤄낼 수 없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는 전략이 그 하나라면, 이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체적 조건을 확립하는 일이다. 특히 노동을 중심에 세우려면 ‘조직된 노동’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풍토를 마련해야 했다.
노동존중사회가 불평등 해소를 겨냥했을 때 그것은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는 것으로 이해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 △평등의 과정으로서 차별 해소와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라면, △노동권을 통한 보호 확대와 연대 촉진 △노동참여의 거버넌스 구축은 노동자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말한다(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발간한 신광영 외, 2018. <노동존중사회: 노동과 균형적 사회성장>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였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담당한 이 연구는 연구진과 경사노위 전문위원 사이의 지속적인 토론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완의 프로젝트, 당나귀에 소금 가마니를 지우고
결과적으로 노동존중사회 구축이란 담대한 프로젝트는 중동무이로 끝났다. 그것은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단체가 ‘통 크게’ 노동존중사회 구축에 동의하고 협력할까라는 질문은 경사노위 상임위원 임기 내내 나를 괴롭힌 질문이었다. 사용자단체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활용해 노동존중사회 구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사회적 대화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는 결국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에 훼방을 놓는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장치에 머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동존중사회 구축이라는 건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동주체라고 하지만 노동자의 조직률이 낮은 데다, 특히 취약노동자의 조직률은 민망하리만치 밑바닥에 깔려있었다. 2018년의 노조조직률은 11.8%로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96만8천35명, 한국노총이 93만2천991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이 50.6%의 조직률을 보인 반면 30~99명은 2.2%, 30명 미만 사업체의 조직률은 0.1%에 지나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18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한편 2018년 정규직 노동자가 17.1%의 조직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 조직률은 3.1%였다.(통계청,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맹사업주와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노동자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은 물론 집단적인 노동기본권조차 허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사회정책은 물론 사용자의 보호에서도, 심지어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배제된 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기본권을 추구할 권리조차 거부당하고 있었다. “가장 밑바닥 하층부란 더 이상 밑바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상 바깥이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이다(<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이들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줄곧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었다. 계층별위원제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도 했지만 ‘탄력근로제 사태’를 맞으면서 계층별위원제는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불안정 노동자, 취약노동자와 같은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일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존중사회라는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역량이나 지반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18년)”한다는 것은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양대 노총은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었다. 언제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될지도, 설령 정상화되더라도 그것이 언제 멈출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노동존중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의 과제라는 게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나의 판단이었다. 사회적 대화는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족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사노위가 노동존중사회 구축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건 당나귀가 물에 젖은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는 격이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까지 수립토록 돼 있던 ‘기본계획’은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채 상임위원 2년(2017년 8월~2019년 8월)의 임기를 마쳤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제출하라는 독촉은 이어졌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데다 그것을 사회적 대화로 작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결국 2020년 9월, 국정과제 점검과정에서 ‘기본계획’이란 말은 삭제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그러나 당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사회의 상을 그리면서 불평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전략은 이른바 ‘다면적 교섭전략’이라는 것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기업) 사이의 자본 내부 교섭과 산별교섭체제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교섭, 그리고 노사 사이의 교섭(기업별 교섭과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 그리고 산별교섭)이었다. 이어지는 주제다.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tjpark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