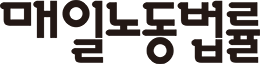업무상 재해 판단에서 정기적 업무뿐 아니라 비정기적 업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김주완 판사)은 크레인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0킬로 망치 들고 수시 정비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장기간 반복적 수행 아냐”
15년 가까이 크레인을 운전한 A씨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역선적하는 작업을 해 왔다.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일주일 평균 6.5일을 일했는데, 이 중 크레인을 운전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오전 약 2.5시간, 오후 약 2.5~5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크레인 정비·수리업무 등을 했다.
정비·수리는 크레인 운전과 함께 주요한 업무였다. A씨는 1996년께 제작된 100톤 규격의 크레인과 2007년께 제작된 90톤 규격의 크레인 등 총 3대의 크레인을 운행했는데, 노후화와 반복적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 기사들이 직접 정비·수리를 해야 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간헐적 또는 일정 주기별로 작업해야 했다.
정비·수리업무는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 크게 작업 와이어 교체, 턴테이블 정비, 엔진·펌프 등 탈부착, 활차 베어링 교체·수리, 기타 작업(볼트·너트 망치질), 유압호스 정비 등이 있다. 정비·수리의 기본인 볼트와 너트를 풀기 위해서만 10킬로그램 상당의 망치 내려치기를 50~60회 반복해야 했다. 한 달에 두 번 와이어를 교체했는데, 300미터 기준 1톤가량의 와이어를 동료들과 밀고 당겨야 했다. 엔진·펌프 등 부품이 고장 나기라도 하면 2명 이상이 힘을 줘야 겨우 드는 정도의 부품을 운반하고, 좁은 공간에 몸을 집어넣은 채로 2시간씩 작업해야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어깨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1년 8월 하역 장비 수리 중 미끄러져 어깨와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서 어깨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부족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말만 듣고 기타 작업 분류”
법원, 근로복지공단 조사 미비 지적
법원은 정비·수리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판사는 “A씨는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정해진 업무를 마치기 위해 크레인의 정상적인 작동에 항상 신경을 기울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크레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 A씨는 각종 부품 정비·수리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무게의 부품을 들거나 잡아당기고, 약 10킬로그램 무게의 망치를 수십 회에 걸쳐 내리치는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취했다”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이 사업장의 크레인 운전기사들 중 A씨만이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A씨의 주도 아래 크레인 정비·수리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 해체·분리 작업도 운전기사들이 해야 했는데, 횟수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A씨 어깨에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조사 미비가 지적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공단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기사들의 정비·수리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업장측 진술을 근거로 정비·수리 작업을 기타작업으로 분류한 이후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지 별다른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업장 대표자는 법정에서 기사들이 정비·수리 작업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판단에 노동자의 정기적 업무 외에 비정기적 업무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 데 의의가 있다”며 “변론 과정에서 크레인 관리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었으나 비정기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유해한 자세에 지속 노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