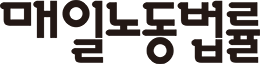폐 절제 수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재해자의 수술 시행일을 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이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폐 절제로 혹 줄었는데
기계적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분진작업 종사자인 이씨는 2018년 4월 A대학교병원에서 폐 일부를 잘라내는 폐쐐기절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씨의 청구를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 일부를 절단하면서 진폐증 판단 기준인 혹의 크기와 개수 등이 줄었는데 이씨가 수술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판단했다. 공단은 같은해 9월부터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받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듬해 9월 B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산재 기준에 미달하는 진폐증 의증을 진단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했으나 또다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6월 이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씨의 진폐병형을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 감정의가 이씨의 2018년 4월 폐쐐기절제술 전후 상태를 모두 고려해 진폐증을 인정한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이씨의 진폐진단일을 두 번째 진단일인 2019년 9월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2021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A대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과 조직검사를 위해 검체채취를 한 2018년 4월을 진폐진단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2018년 5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공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 “수술과 진단서 사이 연속성 인정”
쟁점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에 따르면 진폐 보험급여의 경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한다. 이때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면서,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 등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허준기 판사는 이씨가 A대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은 2018년 4월을 요양 시작일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공단이 앞서 두 차례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내린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씨가 2018년 4월 A대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결절에 대해 절제술이 이뤄졌다”며 “폐쐐기절제술에 의해 진폐결절이 함께 절제돼 개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실제 진폐증 호전에 따른 진폐결절 소실이 아니기에 진폐병형이 낮게 보일 수 있을 뿐 실제 진폐증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이씨가 A대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으며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체취했고 15일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2018년 4월 수술 및 검체 체취와 2018년 5월 진단서 발급 사이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혜강)는 “재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단 처분에 대해 앞선 재판에서 두 차례 법원 감정을 거쳐 최초 진단을 토대로 진폐증 산재를 인정헀다”며 “선행 판결에서 확인된 인정사실에 근거해 진단서 발급과 의학적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요양 시작일을 진폐 진단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