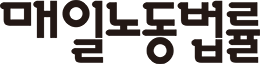1. 사건의 경과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년 3월10일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을 했다. 1999년 대법원이 진폐근로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원고는 2016년 3월 및 2017년 9월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했다.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경 선고돼 확정됐다. 공단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시행했다. 2018년 4월5일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만1천360원(진폐 정밀진단일 2004년 3월10일 당시 평균임금 9만1천23원87전×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8년 5월23일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년 6월20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1심은 장해보상일시금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장해보상일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진폐 정밀진단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3항(평균임금증감 제도 규정)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①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⓷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비춰 2010년 5월20일 법률 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판결의 의의
산재보험법은 각종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보험급여 산정할 필요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 증감 제도 취지에 비춰 볼 때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그 보험급여가 일시금이라는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일시금처럼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또한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장해보상일시금도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재해일로부터 진단일까지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체 없이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논리를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산재 보험급여 실무상 공단의 잘못된 업무 관행,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보험급여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로 지급 지체가 장기화된다면 산재 진단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커져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는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04두2103 판결에서 드러난 평균임금 증감 제도 취지를 고려해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다가 다시 판단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지체된 사정을 고려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지급 행정 전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도 공단이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우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급여가 지급됨에도 공단은 사고일을 기준으로만 보험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