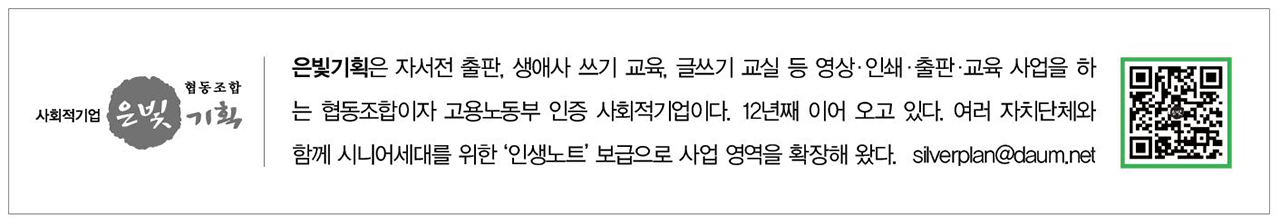나의 일, 나의 일터, 내가 살아 온 날을 기록해 보자. 전문작가의 글처럼 수려하고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나의 삶이 꼭 성공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삶을 기록하는 자체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은빛기획이 노동자들과 퇴직예정자들에게 글쓰기, 자서전 쓰기를 제안한다. <편집자>

나이 쉰이 돼서야 알았다. 말하기·글쓰기 세상이 있다는 걸 말이다. 그전까지는 읽기·듣기 세계 속에서 살았다. 학창시절과 직장생활 내내 그랬다. 선생님과 상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어서, 그들이 하라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됐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 잘하면 좋은 평가와 인정까지 받아 내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는 삶이었다.
나는 기업 회장과 대통령의 말과 글을 써드리는 일을 오래 했다. 말이 글을 쓰는 일이지, 실은 읽기·듣기를 줄곧 했다. 내가 모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읽어서 이를 문자화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쉰 살이 될 때까지 내 글을 써 본 적이 없다. 남의 글을 쓰기 위해 읽기·듣기하기 바빴지, 내 글을 쓸 시간도 필요도 없었다. 하마터면 그러다 죽을 뻔했다.
다행히도 쉰 살에 직장생활을 그만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를 쓰겠다는 데가 없었으니까. 쉰 살은 애매한 나이다. 실무를 보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임원이나 대표를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시기다. 하지만 은퇴하기에는 매우 이른 나이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세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남의 글을 쓰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진 못하지만 프리랜서로 남의 글을 쓸 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긴 싫었다. 다음으로, 내 글을 쓰는 것이다. 이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끝으로 글쓰기에 관해 말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말하기도 자격이 필요했다. 무엇을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가.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쓴 사람에게 말할 권리를 준다. KBS1 라디오에서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을 진행할 때도 경험했다. 300명 가까운 출연자 가운데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섭외 레이더에 잡히질 않는다. 어딘가에 기고를 하거나 책을 쓴 사람이 출연 섭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 다닐 적에는 글을 쓰고서도 내가 쓰지 않았다고 했다. 내게 쓰라고 한 사람이 썼다고 했다.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그러면 나를 고용하는 사람과 조직이 좋아했고, 봉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응당 그래야 했다. 하지만 직장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면 먹고살 수 없다. 글로써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란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의 글이 아닌, 써야 하는 글이 아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비단 내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때가 온다.
앞으로 세상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고령화, 온라인화, 인공지능화다. 이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우리는 초고령 시대, 온라인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 오래 살면 어디에 다니는 기간보다, 다니던 데를 나와서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이게 초고령사회의 문제다. 다행히 어디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온라인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써 주지 않아도, 어디에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팔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이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읽기·듣기의 화신이다. 어떤 인간도 인공지능만큼 읽기·듣기를 잘할 순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공지능은 읽기·듣기를 하고 있다. 잠을 자지도 아프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읽고 듣고 있다. 어떤 인간도 읽기·듣기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다. 하지만 쓰기는 다르다. 인공지능은 읽고 들은 걸 조합할 뿐 창조적으로 쓰진 못한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사람이 해볼 만한 영역이다.
앞서 말하기 위해, 말할 자격을 얻기 위해 썼다고 했다. 내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부터는 거꾸로 쓰기 위해 말했다. 첫 책 <대통령의 글쓰기>는 5년간 말해 보고 썼다. 운 좋게도 사람들은 내게 <대통령의 글쓰기>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물어 왔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래 사귄 지인 모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나?’ ‘재밌는 일화는 없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나?’ 물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도 없이 대답했다.
말하면서 예전 기억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도 났다. 갈수록 조리 있고 재밌어졌다. 분량도 점차 늘어났다. 말하다 보니 어떤 말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알게 됐다. 내 말이 점점 더 글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침내 이젠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우는 특수했다. 말하기를 시작할 즈음 두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사람들은 내게 그분들에 관해 물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었다. 대다수는 나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스스로 자기 주제를 정하고,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하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얘기하면 된다. ‘또 그 얘기야? 너 아주 그것에 미쳤구나. 어떻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야?’ 이런 핀잔을 감수하면서 상대방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하면 된다.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해야 한다. 알아야 말할 것 아닌가. 자신이 정한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 주제와 관련한 경험을 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적어도 주제와 관련한 책과 강연은 모두 섭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주제에 관해선 자신보다 더 아는 사람, 더 열의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할 정도가 돼야 한다. 실제로 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주제를 정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주제도 다양하다. 시간 관리, 인성, 습관, 태도, 인간관계, 리더십, 조직문화, 소통 등등. 이렇게 주제를 정해 파고드는 공부는 재미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숨어서 공부할 정도다.
내 경험으로 공부는 쉰 살 넘어 해야 한다. 그게 진짜 공부다. 왜냐하면 쉰 살 정도는 돼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뭐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30~40대 때는 잘 몰랐다. 50~60대에 걸쳐 공부해 보니 매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다. 매일매일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맞아 이거였어’ 연신 감탄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내게는 공부와 글쓰기를 잇는 징검다리가 다섯 개 있다. 첫 번째는 ‘생각’이다. 나는 공부한 뒤 생각한다. 휴대폰으로 한 꼭지 글을 읽어도, 유튜브에서 15분짜리 영상을 한 편 봐도 생각한다. 혼자 걸으면서, 반신욕하면서,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도 생각한다.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 그걸 메모한다. 어찌 보면 생각하는 시간은 메모거리를 찾는 시간이다. 메모거리를 찾기 위해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메모가 두 번째 징검다리다.
나는 메모한 걸 가지고 세 번째로 아내에게 말해 본다. 메모한 건 거의 다 말해 본다. 말하다 보면 쓸거리가 생각난다. 그렇게 발견한 글을 지난 10년 동안 2만개 넘게 썼다. 나는 요즘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서너 줄씩 매일 글을 쓴다. 이렇게 쓴 문단 분량의 짧은 글이 네 번째 징검다리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 내용으로 글을 써서 어딘가에 기고하거나 연재하면 비로소 나의 글이 탄생한다. 그렇게 10년 동안 글을 써서 열 권의 책을 냈다. 내 삶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