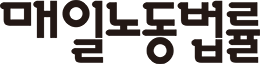편집국장 특별채용에 반발한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언론사 임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임원들은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간부인 기자들의 기사 작성을 금지하는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전기 분야 전문지, 편집국장 특별채용
‘세 달간 500쪽 기사 필사’ 징계 수위 높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에너지 분야 전문지 J사 부사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편집국장 C씨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J사 법인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사건은 C씨가 2018년 7월 공개모집 절차 없이 편집국장으로 특별채용되며 시작됐다. 같은해 설립된 노조는 편집국장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무실 입구에 붙이고, 유인물을 직원들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에 회사는 2018년 8월 이사회를 열고 대자보를 붙인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개월간 20% 감봉을 의결하고, 나머지 조합원 6명은 견책으로 결정했다. 기자 관리에 책임을 물어 부사장과 부국장도 3개월간 10% 감봉했다.
이 무렵부터 ‘노조와해’ 공작이 진행됐다. 당시 사장 A씨와 부사장 B씨, 편집국장 D씨는 팀장들에게 조합원을 만나 노조탈퇴를 권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한 팀장은 조합원을 만나 “회사가 조합원 6명을 전부 내보내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부사장은 자기가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행보에 (노조가) 초를 쳤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노조간부들의 ‘기사 작성’도 금지됐다. 편집국장 D씨는 경력 10년 이상인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기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며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베끼도록 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돼 A4 용지로 500쪽 이상을 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2018년 9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자 징계 수위는 더 높아졌다. 사측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면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징계를 각 정직 6개월로 늘렸다. 노조 사무국장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노조를 탈퇴하거나 미가입했던 직원은 징계를 취소했다. 기자관리 책임으로 징계됐던 부사장과 부국장도 징계를 면했다.
출입처 인증샷에 사무실 유선 보고
법원 “죄질 불량, 피해자 엄벌 탄원”
‘출입처와 출퇴근’ 보고 지시도 뒤따랐다. 노조 사무국장이 정직 이후 의정부로 발령 나자 부사장은 편집국장에게 노조 사무국장이 “매일 출입처 세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오자 사측은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다만 노조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각각 감봉이 결정됐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영 전반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는 부사장으로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해 근로자가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장과 부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하고 있고 임직원 36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 △편집국장이 범죄의 객관적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