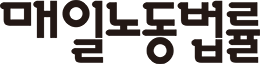회사 사무실에서 취침 중 추락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업주는 자신의 소속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공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승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새벽 퇴근해 현장사무실 수면 중 추락
사업주는 “도의적 책임만” “과로 없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일용직 노동자 A씨(사망 당시 55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10일 서울 영등포의 공사현장에서 오전 1시30분까지 상가 철거작업을 마친 후 하도급 건설업체 Y사의 고양시 현장사무실로 이동해 동료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층에서 자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날 오전 7시30분 문산의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이 예정돼 있어 인천에 사는 A씨는 불과 6시간 만에 다시 출근해야 했기에 집에 갈 수 없었다.
A씨가 숨지자 아내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주와 동료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업주라고 보고 거부했다. 경찰조사에서 사업주가 A씨의 소속이 다르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A씨는 Y사가 임차한 현장사무실에서 숨졌지만, 2년 전 근로계약서에는 K사 소속으로 적혀 있었다.
Y사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일을 마친 후 귀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다가 사망했으므로 본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장 관리팀장도 사고에 A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증언했다. 그는 “A씨가 일 욕심이 있어 휴일에도 Y사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법원 “근로자에 일당 준 실질 사업주”
“일용직 과로 방지 의무 있어” 질타
하지만 A씨 아내는 “현장사무실에 안전시설이 미비해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A씨의 사업주는 Y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가 약 2년 전에 K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사업주를 K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의 사업주는 Y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장 관리팀장과 동료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리팀장은 경찰조사에서 “영등포 현장 노동자들은 모두 Y사로부터 일당을 받았다”고 말했고,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Y사에서 ‘몇 년’ 일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Y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Y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도 A씨가 소속 노동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이라고 봤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재판부는 Y사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관리팀장이 A씨 동료가 현장사무실에서 자겠다고 말했을 때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업주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장사무실의 2층은 높이가 2미터80센티미터에 달하는데도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업주에게 일용직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로서는 오전 출근을 말리거나 적어도 출근 시간을 늦춰 주되 임금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도록 해 A씨가 무리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근로 당시의 실질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의 사업주는 A씨가 사망한 시설물의 소유자였다”며 “불과 몇 시간 뒤 작업을 위해 귀가가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 시설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던 사고로 간주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