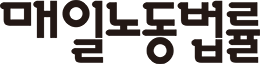광고주 앞에서 회사 대표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해 광고계약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카카오 계열 잡지사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봤다.
“불성실 태도로 회사 명예 실추” 해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된 카카오 계열 잡지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께 패션 잡지사인 B사에 입사해 콘텐츠 제작과 원고 작성 등을 담당했다. B사는 카카오가 2017년 인수한 잡지회사로, 카카오가 투자지분을 처분하면서 2020년 6월 폐업했다. 이후 C사가 사업을 맡아 운영했다.
문제는 B사가 추진한 광고계약과 관련한 광고주와의 미팅 자리에서 불거졌다. B사는 A씨가 광고주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해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철회했다며 2020년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의결했다.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광고주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A씨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 실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9월 B사와 C사 모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 근무 시절 해고됐더라도 현재 경영 중인 C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 “증거 없고 절차상 하자 존재”
C사는 B사와 무관하게 설립돼 잡지를 발행했다며 A씨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는 무효이고, B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C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A씨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사가 B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A씨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가 B사의 폐업 직후부터 잡지를 발행한 점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B·C사가 계열사 관계에 있고 본사 소재지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광고주 앞에서 대표의 지시를 지적했다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때문에 광고계약 체결이 불발되는 등 B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해고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전달하면서 해고를 통지했지만, 서면에 해고 시기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27조)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사에 해고 다음날부터 폐업 시기까지 미지급 임금지급을 주문하고, C사에는 B사의 폐업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기존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B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