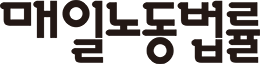노사합의 사항을 따르지 않은 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했다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대표노조에 유리한 타임오프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체크오프’ 기준 타임오프 한도 분배
‘조합원수’ 노사합의 적용 여부 쟁점
사건은 2019년 타임오프 운영과 관련해 포스코가 노조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는 그해 2월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와 ‘근로시간면제 운영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타임오프 한도 시간과 사용 인원은 노조 간 협의해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서 체결일’ 당시 조합원수에 비례해 시간을 임시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합의는 단협 부속협약으로 확정됐다.
이후 지회와 포스코노조는 같은해 5월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를 체결했다. 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타임오프 시간을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포스코는 이듬해 6월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했다. 다만 노조에서 조합원수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수를 합의서 체결일의 조합원수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회는 사측에 조합원수를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연간 2만4천200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중 830시간(조합원 231명)만 부여받았다.
지회는 반발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해야 하는데도 사측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수는 지회는 3천137명, 포스코노조는 4천783명이었다. 또 사측이 지회에 노사합의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중노위가 이를 뒤집고 지회의 신청을 인용하자 포스코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법원 “근거 없이 체크오프만 기준 삼아”
‘노조와해’ 의혹 문건 제시 “불이익 염려”
법원도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 배분은 2019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포스코와 포스코노조는 이 조항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했다”며 “지회는 노사합의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적은 분량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받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임오프 배분은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크오프 내역 등을 근거로 한 조합원수에 비례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되 두 노조가 관련 증빙자료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체크오프만을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9월 제기된 포스코의 ‘노조와해’ 의혹을 언급했다. 정의당은 당시 포스코가 지회 설립에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하며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들은 불이익 처분을 염려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지회 조합원들이 많아 체크오프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지회를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지회는 간부에 대한 불이익 등을 겪었기 때문에 회사에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사합의 내용을 소수노조에 불리하게 임의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