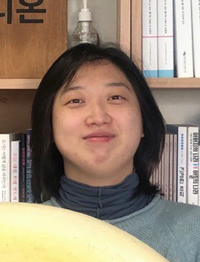
집은 삶이다.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고로 집이란, 사람이 살 만한 집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집에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가 부담 가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주거권이라 부르고, 국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펼쳐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처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 (반)지하나 옥탑(옥상)에 위치한 집, 쪽방,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는 주거빈곤가구라 칭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76만명에 달한다. 매일같이 재개발·재건축 소식이 이어지고, 그토록 많은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 많은 집을 전부 어디로 갔을까.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한다. 사람보다 집이 많다. 자가보유율은 60.6%에 그친다. 집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매년 수십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해 왔다. 그중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6%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과 투기에 따른 이익은 절대 소수의 삶만을 위해 쓰였다. 집이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그간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말을 해 왔다. 언론과 정치인은 월세 사는 건 똑똑하지 못하니 전세 살라는 말을 했다. 세입자가 그 많은 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제대로 된 임대차 규제가 없고 보증금 보호 등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약한 제도적 배경 위에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다. 그 자체로도 불안정한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전세대출 제도가 활성화됐다. 깡통주택 같은 위험한 집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서주는 보증보험 제도가 시작됐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우리는 집을 구한다.
세입자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떼인 채 일상을 잃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는 이들은 정말 폭넓은 연령대와 직업군에 분포해 있다. 사무직·영업직·프리랜서·소상공인·학생·일용직 등이 이 땅 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믿었다가, 돈 많다는 임대인을 믿었다가, 정부 대출과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믿었다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지옥 같은 집에 갇히고, 버거운 빚을 떠안게 됐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에 다름없다.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을 오랫동안 방치해 오면서 생긴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세입자에게 살얼음판인 세상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