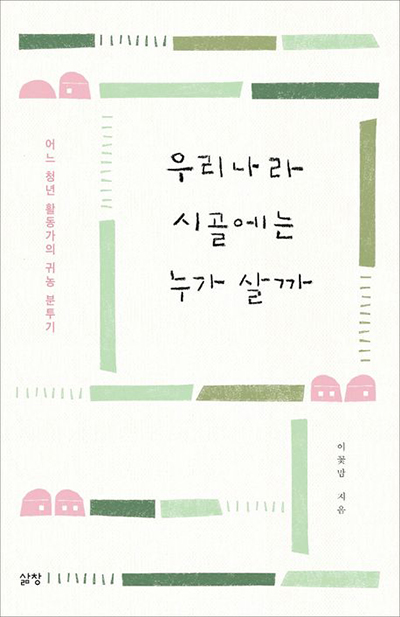
언제부턴가 갑갑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곤 한다. 치열한 경쟁과 자본주의라는 전장에서 멀어질 나이가 되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것만 같나 보다. 그러고는 막연한 시골생활을 떠올린다. 왠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공동체와 어우러지고 느긋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런 생각은 어느 미술 작품에나 나올 법한 낭만주의에 가깝다. 그러면 시골생활과 농사는 아무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느 청년활동가의 귀농 분투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과 욕망의 자본주의를 넘어 선택한 삶
이꽃맘 작가가 펴낸 <우리나라 시골에는 누가 살까>(삶창·1만3천원·사진)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간 젊은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꽃맘 작가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거쳐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와 노조 활동가로 일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하네에게 농부란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유하네가 되려는 농부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유하와 세하 두 아이의 엄마인 이 작가는 무엇보다 “사람을 낳아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유하·세하의 시간 속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농부의 삶은 경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자, 더불어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는 고백이다. 유하네가 선택한 농부의 삶은 여느 귀농의 삶과는 다르다. 유기농을 넘어 기계 자체를 쓰지 않는다. 비닐이나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트랙터 대신 삽질로 땅을 뒤집고 낫으로 풀을 맨다.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농사라고 믿는다. 이 농사에는 작가의 아이들도 함께한다. 유하가 “제 밥값은 누구나 해야 한다”며 개똥을 치우고 잔가지를 모아 땔감 더미를 만들면서 말이다.
자연농법으로 일군 땅이 주는 기쁨, 그리고
이 작가의 시골생활에는 낭만은 없지만 희망이 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온 밭을 뛰어다니며 자연을 접하고, 인근 도시와 시골, 이웃 간 사람들은 연결돼 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밭 만들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렇게 만든 밭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심고, 기다림 끝에 맺은 열매를 보고는 기적이라며 기뻐한다. 이는 비닐과 제초제 등을 선택하지 않은 시골에서 실천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의 시골생활은 외지인으로 인해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농사짓기 어려워진 늙은 농부들은 살기 위해 밭을 외지인에게 팔아넘기거나, 그들이 돌아가시면 마을에 살지 않는 후손들에게 상속된다. 이렇게 외지인에게 장악된 논과 밭은 사라지고 농막과 공장이 들어서고 축사를 짓겠다고 해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한다.
작가 역시 농사짓기 어려운 진흙밭을 빌려서 수년간 기계 없이 ‘포슬포슬’ 썩 괜찮은 밭으로 만들었지만 도시에 사는 땅 주인이 이런 노력을 알까,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떡하냐고 내심 걱정한다. 농촌이, 시골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알 수 있다.
작가는 ‘그럼에도’라고 말한다. 도시로 집중화하는 이 땅에서 시골은 자유이자 용기, 포용, 희망임을 피력한다. 그는 원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키운 작물을 달마다 꾸러미로 싸고, 이웃 집집을 돌며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먹는다. 그렇게 작은 땅이라도 일구는 작은 농부들이 많아질수록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단단하게 커가는 유하, 세하라는 열매”와 함께 젊은 부부의 원칙과 미래가 더 많은 작은 농부들을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