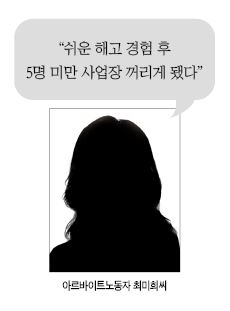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20대 여성노동자 최미희씨도 그랬다. 그는 지난해 11월 영유아 교육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한 수도권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잘렸다. 코로나19로 갈 곳 없는 그에게 실업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졌다.
“다시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안전하지 않겠구나, 아무렇게나 쓰이다가 아무렇게나 잘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지점과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다른 알바보다 50%가량 시급이 높아 좋은 일자리라고 여겼다. 지점장은 구직면접 자리에서 최씨에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안내했다. 일하는 시간과 요일이 매주 달라 다른 알바는 모두 그만둬야 했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과감히 포기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최씨는 지점장 설명과는 달리 학부모 상담까지 하게 됐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였던 최씨에게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이 떨어졌다. 지점장은 전화 한 통으로 계약 한 달 만에 “학부모 상담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최씨를 해고했다. 1년 동안 안정적인 알바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최씨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으며 일을 그만둬야 했다.
억울한 마음에 무료로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봤지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씨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저 ‘다시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알바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새길 뿐이다.
“처음 해고 당시에는 내가 부족해 해고당했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컸었다”고 말한 최씨는 해고통보에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고용주도 알바노동자도 모두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 평등한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