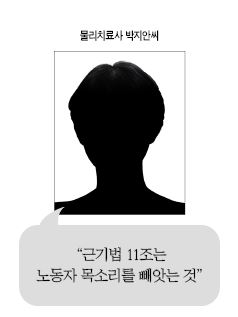
물리치료사 박성란(가명ㆍ54)씨에게 올해 5월1일 노동절은 해고된 첫날로 기록됐다.
“처음 입사할 때 최소한 1년만 일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1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8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박씨는 1992년부터 물리치료사로 일했다. 소규모의 동네의원들을 여러 번 거쳤다. 지난해 박씨는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으로 뽑혀 외국에 갈 예정이었다. 해외봉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에 개업 예정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씨는 적어도 1년을 일하기를 원했다. 1년 뒤면 해외봉사 기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박씨가 입사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은 5명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였다. 2014년 이미 겪었던 해고 경험 때문이다. 말 한마디에 해고당해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
과잉진료 의사에 ‘바른말’했더니
의사 말에 복종 확인서 요구
거부하자 병원에서 없는 사람 취급
박씨는 80평 넘는 공간에 제2원장실과 치료실 세 곳이 있는 병원 규모를 보고 ‘5명 이상 사업장’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구두로 1년은 일하게 해 달라고 했다. 의사는 ‘해외봉사를 다녀와도 계속 같이하자’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간호조무사 2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2명이 근무한 개업 초창기, 나쁠 것이 없었다. 박씨는 수십년간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업한 소규모 의원이 빠르게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월·화·목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 근무, 수·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9시 근무,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2시 근무를 했다. 의사 도움 요청에 환자 진료와 상담도 지원했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가 퇴사한 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이에 필요한 행정 업무도 박씨 몫이었다. 의사와 박씨는 매일 밥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의사와 사이가 틀어졌다. 환자가 하기 싫다는 비급여 진료를 의사가 강제하는 것에 박씨가 과잉진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게 이유였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박씨에게 펜을 던지며 “네가 의사 해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의사는 직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걷었다. 박씨는 서명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박씨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국 해고통보로 이어졌다. 지난 1월 동료 물리치료사가 나가고 병원이 추가 인력을 뽑지 않았다. 의사의 말 한마디면 해고될 수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이 된 것이다. 박씨는 3월30일 해고통보를 받고 한 달 뒤 해고됐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꼼짝 마’법”
박씨는 근로기준법 11조가 노동자들이 부당함에 저항할 목소리를 빼앗는 것으로 본다. 박씨는 자신을 해고한 의사와 법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찾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법률자문을 주는 변호사에게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5명 미만 노동자는 ‘꼼짝 마’인 거죠.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하고 일기를 보면서 임금체불 소송이나 명예훼손 소송을 할 생각이에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제가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게 목적입니다.”
올해 박씨의 노동절은 지난한 싸움을 위한 마지막 휴식시간이다. “쉰넷 먹은 여성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휴가를 쓰느라 생긴 빈자리를 메우는 ‘알바’로도 잘 안 받아 줘요. 지난해도 실직자 신세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