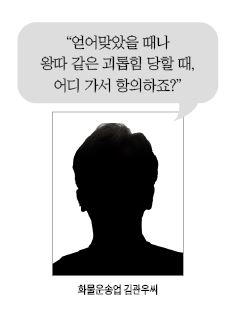
화물운송회사 노동자 김관우(57·가명)씨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벌써 석 달째 김씨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2월부터 김씨에게 무기한 유급휴직을 명령했다.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 그는 회사를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게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탕뛰기’ 전환해 최저임금도 안 줘
운송시 온도 조작 거부했다가 폭행 피해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니 ‘사업장 쪼개기’
노동부 진정 후 징계성 무기한 휴직 통보
김씨는 2008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5톤 트럭 화물운송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후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 하루 식대 1만원, 통신비 3만원, 일요일 휴일근무수당 5만원을 욱여넣은 돈이다.
그러다 2012년 이른바 ‘탕뛰기’로 전환하면서 월급이 폭삭 내려앉았다. 탕뛰기는 일당·기본급이 아니라 차량 운행횟수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회사는 그에게 공동업무계약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40만원, 150만원, 어떨 때는 130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이 들어왔다. 억울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다.
2013년 그는 회사에서 강요한 ‘똑딱이 조작’을 거부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똑딱이 조작은 신선식품과 의약품 운송 과정에서 온도를 조작하는 행위다. 업체 관계자에게 적발된 뒤 “더는 못 하겠다”고 하자 맞았다. 동료 기사가 그를 폭행한 것이다. 합의는 했지만 이후에도 ‘왕따’는 지속됐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관 서류만 보고 문제 없다”
견디다 못한 그는 2019년 회사에 따졌다. 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고.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야. 최저임금 안 줘도 돼.”
그는 노동부를 찾아갔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고 나서야 김씨는 기본급(최저임금)을 겨우 받게 됐다.
그렇지만 해피엔딩은 오지 않았다. 진정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 회사는 2억원대 5톤 트럭 9대를 소유·운용하면서 운송기사도 7명이나 뒀지만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근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다. 김씨를 포함한 운송기사 7명은 서류상으로 회사 4곳에 각각 흩어져 있었다. 그중에는 회사 사장과 이혼한 전 부인 명의로 등록된 회사도 있었다. 같은 일을 하는 화물기사 신분도 일부는 탕뛰기 계약으로, 일부는 ‘알바’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제각각이었다. 그들은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괜히 문제를 키워서 이 일이라도 못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을 시작했다. 등기부등본까지 제 손으로 떼어가며 들춰 낸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러다 덜컥 강제휴직 명령이 내려왔다. 회사는 2월15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씨에게 “거래처에서 불친절, 불성실 사유로 민원이 발생해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고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별도 고지시까지 휴업조치 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징계나 다름없었다.
김씨는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근로감독관은 현장실사 한 번 안 하고 그저 서류상으로 5명 미만이라는 것만 확인한 뒤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김씨는 “알아 보니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해서 떼먹은 월급만 3천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니 이러다 잘려도 항의도 못하겠죠. 얻어맞았을 때나 왕따 같은 괴롭힘 당할 때, 어디 가서 항의하죠? 제발 제도 좀 바꿔 주세요.”

